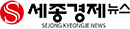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 중 하나가 바로 병문안이다. 가족이든 동네 사람이든 누가 입원이라도 하면 경중을 막론하고 찾아간다. 정서적인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병문안을 오지 않으면 뭔가 섭섭하다. 일반화할 순 없지만 대개 그렇다.
이 같은 문병 문화는 몇 번이나 지적됐었다. 3년 전 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국내 메르스 환자가 빠르게 번진 것을 두고 ‘문병 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여 년 전에 이런 문화가 없어졌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36만여 명의 병원 내 감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상주할 때 폐렴 감염률이 곁에 있지 않은 경우보다 7배나 많았다.
환자는 기침을 해대는 데, 보호자는 안쓰러운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게 감염의 주된 이유다. 일반적으로 좁은 병실에 환자 5~6명이 모여 있으니, 병균을 죄다 들이마시는 셈이다. 2015년 당시 메르스 확진자 186명 중 65명이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 방문객들이었다. 이들 중 사망자도 있었다.
그뿐인가. 최근에는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로타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문병객들의 출입을 통제했었다. 실제로 청주 A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40명 중 16명이 로타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돼 담당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에도 신생아 51명 중 15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걸려 휴원까지 했었다.
다행히도 병원 곳곳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문안 자제 운동을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을 운영 중인 청주의료원의 경우 환자와 직원, 내원객을 대상으로 철저한 감염 관리를 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자, 간병인 등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면서 감염 ‘제로’를 외치고 있다.
도내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자체적으로 병문안 허용시간을 두거나 외부물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식이다.
또,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들여 각 병동 입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9월 1일부터는 병문안 시간 외 병동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청주시와 충북대학교병원, 충북도의사회, 청주시의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병문안 문화 개선 충북 민‧관 합동 선포식’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9월 11일에도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광장 앞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무분별한 병문안으로 환자와 내방객 모두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확산시키자는 게 취지였다.
이렇듯 이는 병원만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범시민 운동으로 번져야 한다. 병문안은 환자나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예의’ 지키다가 병을 달고 오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굳이 병문안을 꼭 가야겠다면 해당 병원의 통제에 따르자. 우리가 협조해야 제도적인 정착이 가능하다.